송태정 강중구 윤상하 | 2008-12-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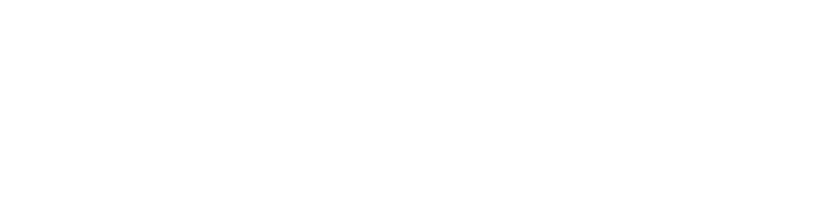

최근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는 과정을 지나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불안을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spiral)의 고리가 형성되는 ‘위기의 제2라운드’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과거 미국이 겪었던 주요 침체기와 비교해 본 결과, 통화량 등 일부 지표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도 했으나 자산가격, 기업부도 발생 가능성, 금융기관 실패 정도와 금융중개기능 등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조정되는 디레버리지(deleveraging) 과정도 기다리고 있어 이번 미국의 경기침체는 과거보다 낙폭이 크고 침체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실패를 초래한 원인인 만큼 주택가격이 우선 안정되고, 가계 부실과 기업 부도 위험이 줄어들어야 회복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불황 탈출의 신호(Signpost)는 과거처럼 금융 부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신용경색,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용경색이 해결되어야 실물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회복의 시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종합주가 대비 금융주가 비율과 신용스프레드 등 신용위기 관련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과 신용위기의 해소없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 목 차 >
Ⅰ. 실물 경제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
Ⅱ. 경기침체 얼마나 심할 것인가
Ⅲ. 불황 탈출의 신호는?
Ⅳ. 맺음말
Ⅰ. 실물 경제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막론하고 실물경기 침체로 번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올 상반기 중 1.9%였던 경제성장률이 3/4분기에는 -0.5%로 급락하였고, 유럽과 일본은 2/4분기와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유럽과 일본에 이어 미국마저 경기침체를 선언하면서 세계 3대 경제권이 모두 공식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그림 1> 참조).
신흥국들에서도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가 영향을 받는 등 실물경기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두 자리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시현하며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중국은 지난 3/4분기에 9.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쳐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경기침체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OECD 경기선행지수뿐 아니라 신흥시장을 포함한 세계경기선행지수(OECD+신흥시장) 모두 급락 양상을 보이며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약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최소한 18개월 이상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평균 경기침체 기간인 10.3개월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더구나 선행지수의 저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마저 최근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이번 위기의 진원지이자 세계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과거 미국이 겪었던 주요 침체기와 비교함으로써 이번 미국의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를 가늠해 본다. 둘째, 아무리 심각한 침체라도 경기는 언젠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경제가 회복된다면 회복의 조짐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지, 미국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될 경우 그 신호(Signpost)가 어디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과거 불황기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Ⅱ. 경기침체 얼마나 심할 것인가
현재 세계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앞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금융위기를 다시 심화시키는 ‘위기의 제2라운드’로 진입할 것인가이다(<그림 3> 참조). 제1라운드는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만들어진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의 부실화가 진행, 금융기관 파산과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주가 폭락과 신용경색 → 소비와 투자 위축 → 소득과 고용 감소 등의 과정을 거쳐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의 제2라운드’는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 부도와 가계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 → 신용축소와 자산가격 하락을 재차 야기할 수 있는 단계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 9월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제1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금융불안과 경기침체의 악순환(spiral) 고리가 형성되는 ‘위기의 제2라운드’ 진입을 차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유발한 주된 요인들의 현재 상황을 과거 침체기와 비교해 본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주택가격과 주가 등 ▲자산가격 하락을 먼저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실패와 신용경색 ▲가계부실 및 기업부도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위기의 제2라운드’ 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1. 자산가격 하락
미국 주택가격 하락세 사상 최고 수준
2005년 3/4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낙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3/4분기에는 미국 주택기업감독청(OFHEO)의 전국주택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명목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그림 4> 참조). 1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S&P의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17.9%나 폭락하였다. OFHEO 지수는 미국 전역을 포함하지만 확정 모기지 대출만을 반영하는 반면 Case-Shiller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까지 반영하고 있어 그 낙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OFHEO 지수를 기준으로 한 명목 주택가격의 변동률을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해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시점을 0으로 놓고 그 이전 10분기부터 이후 10분기까지 총 21분기 동안의 명목 주택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05년 3/4분기부터 시작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는 2008년 1/4분기부터 본격 마이너스로 접어들어 그 낙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금융기관의 부실이 있었던 저축대부조합(S&L ;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파산사태나 2차 오일쇼크 시기에는 주택가격 둔화 양상이 지금에 비해 훨씬 완만하였으며 IT 버블기에도 급락세는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주가 폭락 또한 2차대전 이후 최대
주가지수의 경우 2008년 2/4분기에 다우존스 지수(Dow Jones Industrials Price Index)를 기준으로 -2.6% 하락을 기록한 이래 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4/4분기 현재 -30.9%의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것은 2003년 2/4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1차 오일쇼크 발생 이후 세계 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졌던 시기인 1974년 4/4분기에 30.7% 하락했을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최대의 폭락장이다(<그림 6> 참조). IT버블 붕괴 당시 등락을 거듭하다 2003년 1/4분기에 -19.8%를 나타냈던 것에 비해서도 최근 주가의 하락 속도와 낙폭은 훨씬 크고 빠르다. 2007년 4/4분기에 13,657포인트를 기록했던 다우지수가 4/4분기 현재 9,433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동안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주가와 집값 하락, 실물에 크게 영향
문제는 이와 같은 주가 및 집값 하락이 역(逆)의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와 투자, 생산 등 실물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는 2007년 4/4분기에 -0.2%(전기비 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미국 정부의 세금 환급 등 각종 부양책으로 잠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 2008년 3/4분기에 -0.5%를 나타내어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기에는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3.7%)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산업생산 역시 3/4분기에 -7.6%를 나타내었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집값과 주가 등 자산가격과 소비, 투자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비증가율은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과 모두 0.36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주가와는 0.30인 반면 주택가격과는 0.07로 큰 관계가 없었다. 주가의 변화는 집값보다 기업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가와 0.16, 주택가격과는 0.51로 건설경기와 주택가격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과 같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소비,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위축을 부르고, 일반적으로 경기에 동행 내지 후행하는 주택가격의 하락은 건설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spiral)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택가격 폭락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나타나 건설투자는 200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올 3/4분기 현재 건설투자 증가율은 -20.9%를 기록하였다(<그림 7> 참조).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82년의 더블 딥(double-dip) 기간과 저축대부조합 파산이 한창이던 1991년에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험이 있으나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향후 건설투자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주가 하락까지 겹쳐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 금융기관의 실패와 신용경색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실패가 일어나
작년 하반기 이후 주요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금융기관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패니메이(Fannie Mae) 등 국책모기지기관의 구제금융, 리먼브라더스(Lehman Borthers)와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 일련의 사태들은 전형적인 금융기관 실패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후 벌어진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은 금융기관 도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모기지 연체율이 6.4%로 상승하고, 주택압류 대출금 비율이 3.8%에 이르는 등 미국 내 금융기관 모기지 대출 관련 부실은 금융기관 실패의 불씨가 되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달로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전세계 금융기관이 입은 누적 손실액은 올 4/4분기를 기준으로 9,66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금융기관 실패로 기록될 듯
최근 금융기관 실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의 은행 도산 관련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 1930년대 초 대공황 기간에는 3차례의 대규모 은행도산 사태가 있었으며, 1933년에는 약 4,000개의 은행이 도산하였다. 대공황 이후의 대규모 은행도산 사태는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파산을 들 수 있다. 1989년에 534개 은행이 도산하였고, 1995년까지 부실조합 처리를 위해 4,899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가맹 기준 은행도산 건수는 2007년 이후 25건에 불과하여 단순히 도산 수로 본다면 최근의 위기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도산은행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을 보면 최근 위기가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와 유사한 크기의 충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특히 이러한 FDIC 자료는 상업 및 저축은행들의 자료이고, 최근 대형 투자은행이나 국책모기지기관 등 가맹은행이 아닌 기관들의 도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대공황이나 저축대부조합 파산과 달리 정책당국의 신속한 구제금융이 뒤따르고 있어 실제 도산 건수는 적지만, 대형은행의 도산으로 자산규모로는 최근 충격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은행의 자산규모가 큰 만큼 대손상각액도 급증했다. FRB의 상업은행 상각액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침체기와의 충격의 크기를 1986년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기와 비교하여 보면, 상각액 증가율이 이전 두 번의 침체기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아직까지 손실규모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데다 투자은행, AIG 등 보험사의 상각규모를 포함할 경우 상각액의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를 것이다.
금융기관의 파산은 일반 기업의 부도에 비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통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 실패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기존 은행들의 대출행태를 보다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최근과 같이 손실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운 사태일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종합주가 대비 금융주가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금융기관 신뢰도 하락의 정도는 과거 경기침체기 보다 크고, 하락 속도도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0> 참조).
과거 금융기관 실패시 FRB의 정책대응에 따라 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현재 위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금융중개기능 마비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실패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붕괴는 신용경색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간 거래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에 따라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의 자산 축소에 따른 디레버리지(Deleveraging) 과정에서 유동성 제약은 신용경색을 보다 심화시키고 은행 및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증대시켜 실물경기 침체를 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와코비아(Wachovia), 씨티(Citigroup) 등 대형 상업은행들의 막대한 손실이 차츰 밝혀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래당사자의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은행간 자금거래가 막힌 것이다. 금융기관 간 유동성 경색의 정도는 대표적으로 TED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은행간 대출금리인 리보금리(3개월물)와 무위험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미 국채금리(3개월물) 차이인 TED 스프레드는 올 9월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급등하여 10월에는 평균 287bp까지 상승한 후 11월에는 197bp로 하락했다(<그림 11> 참조). 그러나 과거 위기와 비교하면, 저축대부조합 파산 당시의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전히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 현상은 은행간 자금거래의 경색 뿐 아니라 회사채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위험도가 높은 고수익 상품인 ABS, CDO 등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존 투자 역시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 파생금융상품의 신규발행이 작년 9월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회사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거래 역시 크게 위축되어 잔액 기준으로 작년 7월 대비 회사채는 78%, ABCP는 58%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졌다(<그림 12> 참조). 특히 회사채 신규발행액이 작년 4/4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더니, 올 3/4분기 이후에는 작년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등 채권발행시장에서 심각한 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채권시장의 위험회피 경향을 과거 침체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신용스프레드(=회사채Baa 금리-국채 금리)를 구하여 보면, 최근의 신용스프레드가 과거침체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IT버블 붕괴에 따른 벤처기업들의 도산, 헤지펀드 손실 등으로 2001년 침체기에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했으며, 현재는 2001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용스프레드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부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기업의 신용경색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통화의 유통속도도 하락하고 있다. 명목GDP를 광의통화(M2)로 나눈 통화유통속도는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신용창출이 줄어들수록 떨어진다. M2 통화를 기준으로 유통속도를 살펴보면, 2001년 저점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상승하다가 최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통속도의 하락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저축대부조합 파산 당시보다는 빠르고, IT버블 붕괴기보다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경색 심화, 신용축소로 실물경제 악영향 확대
최근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금융기관 실패에 따른 은행들의 자산축소 과정과 맞물려 실물경기 침체를 보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경기호황 시 신용확대가 투자 및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면, 반대로 신용축소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신용축소과정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유동성 위기는 은행 및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더욱 높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자금순환흐름 상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가계+비금융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급감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IT 버블 붕괴 당시에는 기업 신용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주택가격 상승 속에 가계부문의 신용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2005년 GDP 대비 10%를 상회한 가계 신용 증가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의 유동성 위기 속에 신용둔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문의 신용둔화 속도는 과거 경기침체기에 비하여 가장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 둔화가 이번 위기에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문에 이어 기업들의 신용도 둔화되기 시작해 실물경기의 침체 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침체가 비금융 충격에 따른 침체보다 강도가 훨씬 크고, 침체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5> 참조). 금융위기 중 특히 은행관련 금융충격이 올 경우 침체의 강도가 GDP의 14.4% 평균 누적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금융위기 중 비은행 관련 충격 시 5.1%, 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누적손실 4.4%보다 강도가 3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기간 역시 은행관련 충격이 평균 8분기의 지속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충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체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가계 부실과 기업 부도
자산가격 하락과 함께 신용경색, 경기침체가 과거에 비해 심각해지면서 가계 부실화와 기업 부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이 풍부한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수요가 급증하였고, 금융기관들은 대출붐을 일으켰다. 자산가격 상승 속에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신용경색 속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인들은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부채 상환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은 매출과 수익 감소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번 경기침체가 가계 부실과 기업 부도로까지 확산된다면 실물경제 침체가 금융 불안을 다시 야기하는 ‘위기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가계부실지수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의 경기침체가 미국의 가계부실을 얼마나 심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실지수를 구해 보았다. 가계부실지수는 이자상환비율과 실업률,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 저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G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지표로서 가계의 부실 정도뿐 아니라 부실화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박스기사 참조).
가계부실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2000년대 들어 크게 높아져 가계부문의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6> 참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경기침체기에는 부실지수가 계속 높아졌으나 이번에는 부실지수가 더 상승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실지수가 거의 정체하고 있는 것은 가계저축률이 소폭 개선되고 이자상환비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가계저축률은 소득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을 더 크게 줄이면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가계는 취약해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소비성향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1/4분기 중 0.2%까지 떨어졌던 가계의 저축률은 4~10월에는 평균 1.8%로 높아졌다. 과거 침체기와 달리 이번에는 가계들이 본격적으로 재무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지출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이자상환비율(=부채이자지급/개인가처분소득)의 경우도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있다. 이자상환비율은 부채의 증가 속도와 금리에 매우 민감한 변수인데 최근 가계 부채의 축소 움직임과 함께 통화 당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로 이자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최근 수년간 하강 추세를 보였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컸음을 의미한다. 향후 개인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부채가 줄어들 여지는 있지만, 실물 경기침체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부채상환능력의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반면에 실업률의 경우 향후 가계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이다. 2006년 4/4분기 4.2%였던 실업률은 2007년부터 오름세로 반전되어 올 3/4분기에는 6.0%까지 상승하였다. 실업은 가계의 소득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가계부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변수이다. 앞으로 실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가계부실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경기침체기에도 실업률은 어김없이 상승세를 그림으로써 가계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이 있다.
앞으로 가계부실은 실업률이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가계부실지수가 소폭 낮아지더라도 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가계 부실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부문 : 예상도산확률 급등
기업부문의 부채는 가계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해 부채규모로 판단한 기업의 부실 가능성은 가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그림 17> 참조).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및 수익 감소와 신용경색은 대규모 기업 부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부도율 추이를 살펴보면, 저축대부조합 파산기와 IT 버블 붕괴기 등 두 차례의 큰 피크가 있었다.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에는 1천여 개가 넘는 대부조합이 문을 닫았으며 IT 버블 붕괴기에도 과도한 차입과 매출 악화로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감원, 대량 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2008년 4/4분기 현재 회사채의 부도율은 1.2%로 피크를 이루었던 시기의 4.8%, 5.0%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2007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Hurley & Johnson(1996)이 제시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의 채권에 대한 예상도산확률을 간단히 계산해 보았다. 이는 시장금리의 가격에 도산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채권의 도산 위험을 채권수익률 간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박스기사 참조). 추정 결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미국기업의 예상도산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4분기 현재 회사채(Baa)의 도산확률은 11%로 과거 고점이었던 8%에 비해서 크게 높다(<그림 18> 참조). 예상도산확률이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도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지난 호황기 때 비축한 자금여력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주는 등 각종 자금지원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 기대에 못미칠 경우 ‘위기의 제2라운드’ 진입
가계 부실화와 기업 부도 위험을 진단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금융 부실을 야기할 정도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자산가격 폭락과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 부실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미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 9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5.25%에서 현재 1.0%로 4.25%p 인하하였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경색현상이 풀리지 않자 손실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미 재무부의 MMF 자금 보증, ABCP 직접매입 등 보다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다. 일별 기준으로 400bp 이상까지 확대되던 TED 스프레드가 11월 들어 200bp 이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스프레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현상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통화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대공황 당시 극심한 경기불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금본위제 제약 하에서 통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통화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거 침체기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계나 기업 부문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거나 부양책으로도 보완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가계 부실과 기업 부도 위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데다 Alt-A, 프라임 연체율도 동반상승하고 있다(<그림 19> 참조). 더 큰 문제는 연체율 상승이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부실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 부실보다는 파급효과가 적지만 또 다른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가계 부실화와 기업 부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금융부실은 불가피하고, 이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는 현재와 차원이 다른 ‘위기의 제2라운드’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Ⅲ. 불황 탈출의 신호는?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상황을 과거 미국이 겪었던 주요 침체기와 비교해 본 결과, 이번 미국의 경기침체 정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순환의 특성상 아무리 심각한 경기침체라도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기 마련이었다. 특히 이번엔 각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불황기와 다르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된다면 그 회복의 신호(Signpost)가 어디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과거 불황기 경험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주가, 신용 스프레드가 경기 회복 신호
1, 2차 오일쇼크와 저축대부조합 사태, IT 버블 붕괴 등 총 4회에 걸친 과거 위기의 경기저점, 즉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한 주요 지표들의 평균치 흐름을 살펴본 결과, 불황 탈출의 신호는 먼저 금융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주가지수 대비 금융주가 비율과 신용스프레드(=비우량 회사채 금리-우량 회사채 금리)가 저점에 선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0> 참조). 먼저 종합주가지수 대비 금융주가 비율은 금융 불안에 대한 정보가 주식시장을 통해 반영되어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경기 저점에 6개월 앞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금융업종 주가의 상대적인 하락은 금융업의 자본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융불안의 신호가 되는 반면, 반대로 금융업의 상대적 주가 상승은 주식시장에서 금융업에 대한 자본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자의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실패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미래의 자본가치를 반영하는 금융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거나 덜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어들면서 시중에 자금이 돌아 신용경색이 완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위기 시에는 평균적으로 경기 저점 2개월 전부터 신용 스프레드가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자금 경색 완화 초기에는 우량채권부터 소화되다가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호전되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의 투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우량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낮아져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의 평균치만을 가지고 지표들의 움직임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신호는 각 위기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겹친 현재와 위기의 성격이 유사한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7월부터 8개월에 걸쳐 경기 침체가 진행되었던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에는 앞서 언급했던 위기의 전체 평균과 지표들의 움직임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금융주가의 상대적 비율은 경기저점 5개월 전에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신용스프레드는 2개월 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저점으로 다가설수록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 관련 지표의 움직임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글로벌 경기침체도 금융기관간의 유동성, 신용경색 문제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불황 탈출의 신호(Signpost)도 금융 관련 지표에서 먼저 나타날 공산이 커 보인다. 신용위기의 해소없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물 지표는 경기 저점 이후 회복세
먼저 유동성 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온기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과거 위기 시 지표들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산업생산과 제조업 판매 등 실물지표들은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세로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 참조). 유동성이 개선된 이후 실물경기 지표들이 바닥을 찍으면서 생산과 투자, 판매 활동 등이 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후행하여 취업자수가 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소득의 증가가 금융기관의 상각률과 연체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는 경기 저점이 확실히 지났음을 확인시켜주는 후행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그 후 경기 회복 국면이 더욱 진행되면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시장에 확산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 대출과 기업 대출이 늘면서 신용 완화 기조가 본격적인 신용 확대 기조로 전환되어 경제 전체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 주택가격 안정이 전제된 신용 경색 완화가 중요
그렇다면 현재 위기의 핵심인 주택가격의 경우 과거 침체기에 어떤 신호로 작용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침체기 동안의 월별 주택가격(Case-Shiller 지수 기준)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가격은 침체 시작 이전에 상승세가 둔화(또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침체가 끝난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기별 가격지표(OFHEO 지수)의 경우에는 2차 오일쇼크와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 1분기 정도 저점에 선행하여 하락세가 안정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택가격이 신용경색 완화의 선행 지표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침체는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기 때문에 집값의 안정 없이는 신용경색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신용 위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용 경색이 해결되어야 실물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위기 탈출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회복의 시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관련 지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만큼은 금융 부실의 원인이었던 주택가격이 금융지표에 선행하여 먼저 안정 되어야만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후에야 금융주가의 상대적 회복 → 신용스프레드 하락 → 생산, 투자 등 실물 활동 회복 → 취업자 수 증가 및 실업률 하락 → 소득 증가 → 상각률, 연체율 하락 → 신용창출 정상화 싸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최근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는 과정을 지나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불안을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spiral)의 고리가 형성되는 ‘위기의 제2라운드’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과거 미국이 겪었던 주요 침체기와 비교해 본 결과, 통화량 등 일부 지표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도 했으나 자산가격, 기업부도 발생 가능성, 금융기관 실패 정도와 금융중개기능 등 대부분의 지표들은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조정되는 디레버리지(deleveraging) 과정도 기다리고 있어 이번 미국의 경기침체는 과거보다 낙폭이 크고 침체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실패를 초래한 원인인 만큼 주택가격이 우선 안정되고, 가계 부실과 기업 부도 위험이 줄어들어야 회복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불황 탈출의 신호(Signpost)는 과거처럼 금융 부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신용경색,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용경색이 해결되어야 실물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회복의 시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종합주가지수 대비 금융주가 비율과 신용스프레드 등 신용위기 관련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 안정과 신용위기의 해소없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Felton, Andrew and Carmen Reinhart, "The First Global Financial Crisis of the 21st Century", CEPR and A VoxEU.org Publication, 2008
Hurley, William J. and Lewis D. Johnson, "On the Pricing of Bond Default Risk",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Winter, 1996
IMF, "World Economic Outlook : Financial Stress, Downturns, and Recoveries", October, 2008
Kindleberger, Charles P., "Manias, Panics, and Crashes-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5th eds., 2006
Mizen, Paul, "The Credit Crunch of 2007-2008: A Discussion of the Background, Market
Reactions, and Policy Responses", FRB of St. Louis Review, september/october, 2008
Mody, Ashoka et al., "A Cross-Country Financial Accelerator: Evidence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Vol. 26, 2007

